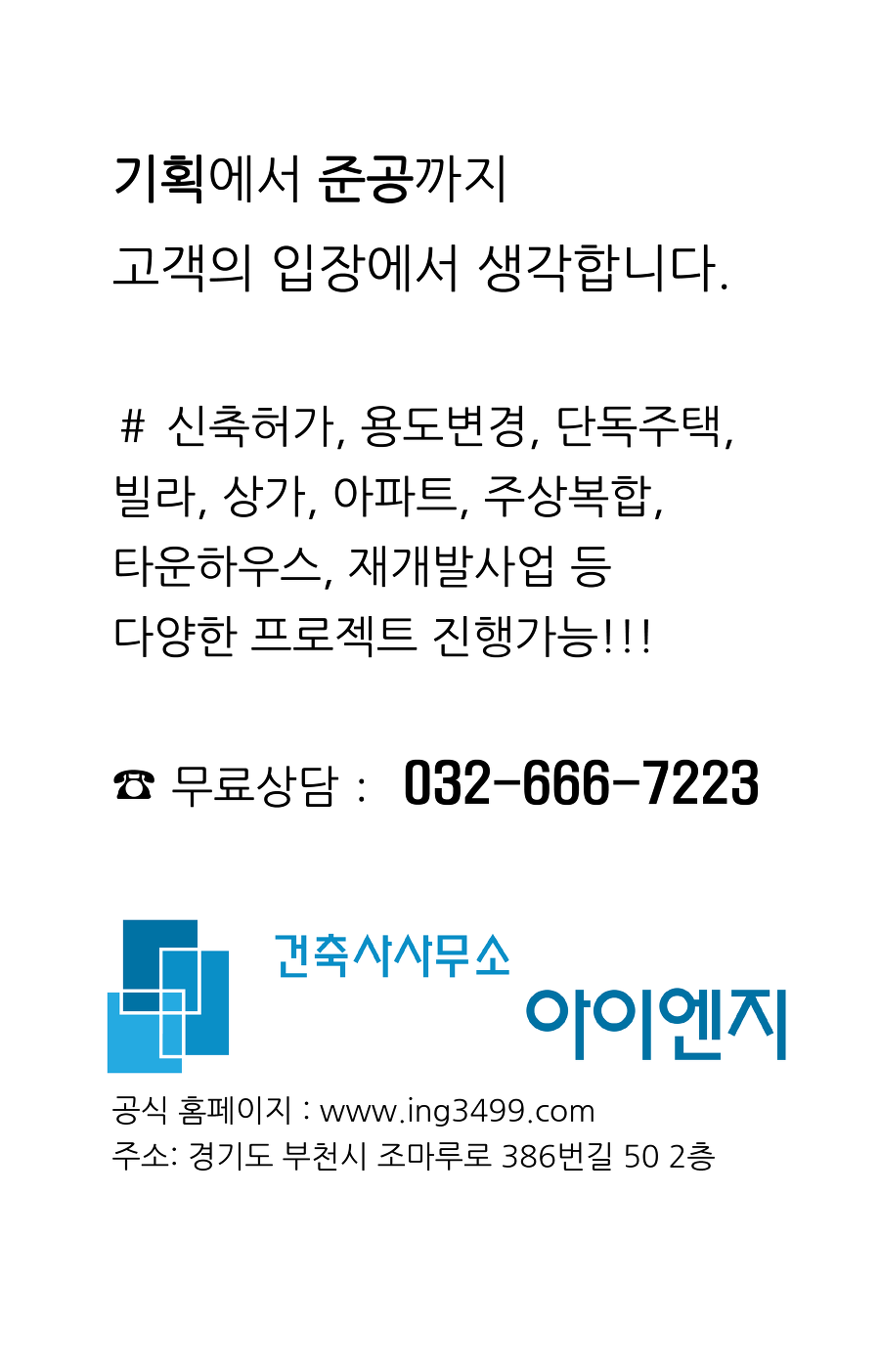1. 에게 해 건축과 초기 그리스건축의 성립 (2-2)
<아트레우스의 보고>와 둥근 천장
무덤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매장 형식이 다양해진 점과 이것을 집대성한 원형 공간이 등장한 점입니다. 미케네의 무덤은 성채와 한 몸이 된 왕궁의 일부로 부속되면서 피라미드 같은 독립성은 없어졌지만 매장 형식이 다양해지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고대 문명을 거치면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매장 형식인 석관묘, 갱묘, 묘실형, 톨로스 등의네 가지가 모두 쓰였습니다. 이 가운데 파일로스가 원형 공간의 모태가 되었는데 이전의 톨로스가 원형 지붕까지 갖추지 못하고 평면만 원형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미케네에서는 지붕까지도 원형으로 해서 평면과 일체가 되는 종합적 구성을 완성했습니다.
<아트레우스의 보고>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케네 문명 전반에 걸쳐 왕의 무덤이 여럿 지어졌는데 대부분 톨로스 형태였습니다. 순장 전통이 남아 있어서 많은 금은 보화도 함께 묻었기 때문에 무덤 대신 '보고'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보통 톨로스는 암벽을 둥글게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둥근 천장을 만들었는데 <아트레우스의 보고>는 이것을 모델로 삼아 도를 쌓아서 둥근 천장을 만든 점에서 건축 기술의 발전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이룹니다. 보존 상태가 제일 좋고 원형 공간의 구조 기술이 가장 발전하였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원시적 영웅주의와 결부된 상징성에 치중한 반면 이 보고는 규모는 작아진 대신 원형 공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 윤곽이 처음 잡히기 시작했으며 이것을 구조물로 구현하는 기술 발전이 있었습니다.
전체 구성은 드로모스라고 부르는 30여 미터 길이의 통로를 거쳐 출입문을 지나 원형묘실에 이르는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 출입문 위에는 120톤이 나가는 석판이 상인방으로 놓여있는데 6x7 미터의 크기에 두께는 1.4미터였습니다. 둔탁한 고대 거석 구조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두께를 앏게 하면서 위쪽 벽체에서 내리누르는 무게가 문제가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벽체를 파내 진공 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처리 방식을 릴리빙 아치 라고 부르는데 벽을 파낸 만큼 가벼워져서 무게의 부감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관건은 둥근 천장인데 여기에서는 아직 완전한 반구에 이르지 못하고 기다란 역깔때기 모양에 머물렀습니다. 조적술로 완전한 반구의 둥근 천장을 만드는 기술은 아치를 3차원으로 회전해야 가능한 매우 어려운 기술이어서 로마의 판테온에나 가서 완성됩니다. <아트레우스의 보고>에서는 내어쌓기 라는 다소 원시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꼭대기가 뾰쪽한 역깔때기를 만드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33단의 원형 벽을 위로 올라갈수록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쌓은 뒤 맨 위 단은 뚜껑을 덮듯이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원형 공간은 지름이 13.2미터, 높이는 14.5미터 였습니다. 원은 그 자체가 하늘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등 기하학적 특수성이 강한 도형입니다. 원형 공간을 축조하기 시작하면서 서양 건축은 사각형 중심의 고대 오리엔트 건축과 차별화 되며 진일보한 단계로 집입했습니다.
초기 그리스 건축의 성립
기원전 1200년경이 되면서 그리스 본토의 지방에서 도리안 족이 유리한 자연환경과 그리스 일대의 발달한 문명을 손에 넣기 위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본토로 진출을 꾀하던 미케네 문명과 충돌하며 100여년 간 전쟁을 치르렀습니다. 이 전쟁은 도리안 족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청동기 문명에 대하 철기 문명의 승리였습니다. 미케네 문명은 처동기 문명의 마지막 단계였고 도리안 문명은 서양 지역에 등장한 최초의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이후 그리스 반도에는 철기 문명에 의해 이전의 청동기 문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건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바다 건너 소아시아에서 건너온 이오니안족이 합류한 것이 었습니다. 두 민족은 큰 정쟁 없이 잘 융합해서 그리스 문명의 모태를 형성했습니다. 두 민족은 많이 달랐습니다. 도리안 족은 대륙적 기질과 합리적 이성으로 무장했으며 법규에 능한 남성적 민족이었던데 반해 이오니안 족은 소아시아와 그리스 반도의 에게 해 연안 일대에 근거지를 둔, 좀 더 부드럽고 감성적 기질을 가진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일대일대응은 무리이나, 굳이 비유를 하자면 '스파르타식 대 아테네식'의 대별 구도에서 도리안 족을 스파르타에, 이오니안 족은 아테네에 각각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스파트타와 아테네로 대표, 대별되는 쌍 개념을 하나로 통합해낸 데 있듯이 도리안 족과 이오니안 족의 통합은 그리스 문명이 싹트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1000년경이었습니다. 이후 크고 작은 전쟁 등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리스 문명은 비교적 안정된 양상으로 전개되며 조금씩 완성된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 반도 일대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통합되면서 작게는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의 틀을 다졌고 크게는 이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리스 세계라는 큰 문명 세계를 이루어 갔습니다.
도리안 족과 이오니안 족의 통합이 완료된 시점은 기원전 800년경이었습니다. 이후 100년 정도의 준비기를 더 거친 뒤 그리스 문명은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약 400여년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 건축의 시대 구분은 한 가지로 통일된 의견은 없으나 기원전 1100년부터 기원전 700년까지의 암흑기, 기원전 700년부터 기원전 480년까지의 아르카이크기, 기원전 480년 부터 기원전 323년까지의 고전기로 구분하는 것이 제일 보편적입니다.
철기 문명과 신전사회
그리스 건축은 그리스 문명이 그러하듯이 철기 문명의 산물입니다. 이전 청동기 문명의 고대 오리엔트 건축과 비교했을 때 거석 구조는 사라졌지만 건물이 작아진 대신 부재의 수가 많아지고 디테일이 섬세해지며 조합이 복잡해지는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철기 문명으로 발전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입니다. 도구의 관점에서 보면 강도가 세진 철기 덕분에 섬세한 가공이 가능해진 결과입니다.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철기 덕분에 승전이 많아지면서 노예가 늘어나고 생산도 향상되면서 사회 전반에 일어난 변화의 산물입니다. 중산층 이상인 남성들의 여유 시간이 많이 지고 직업이 세분화되면서 분야별로 전문직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군역과 노동 등에서 해방되어 여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전문적 일에 몰두할 수 있었고 건축과 예술도 섬세해지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건추과 그리스 문명은 신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대 오리엔트 건축의 5대 건축물이었던 성채, 무덤, 왕궁, 신전, 탑 가운데 신전으로의 집중이 두드러 졌습니다. 신전은 제일 중요한 건축물이었을 뿐 아니라 단순한 건축물을 뛰어넘어 사회 전체의 중심체 역할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종교 건물이었지만 신전에서는 제사만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집회, 시민 활동, 축제 법령반포 등 중요한 사회 활동이 벌어지는 배경의 장이었습니다.
신전은 사면을 에워싸는 기둥 열, 삼각 박공을 갖춘 지붕, 실대 공간인 셀라로 구성됩니다. 기둥은 단순히 구조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아래로 는 기단과, 위로는 지붕과 합해지면서 오더라는 종합적 구조체로 작동했습니다. 오더에는 그리스 문명을 일군 두 민족의 이름을 따서 도리스식과 이오니아식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이름은 그대로 신전 양식의 명칭으로도 통용됩니다. 나중에 후기 그리스 시대 때 새로 만들어지는 코린트식까지 합하면 그리스 고전 예술을 대표하는 3대 양식이 된다.
오더에는 여러가지 상징체계가 실렸는데 장식과 비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장식은 바깥 보의 외부와 지붕 박공이 돋을새김이나 그림 형식으로 들어갔는데, 신화나 승전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었습니다. 구성 부재 수가 많아지고 각 부재는 정밀해졌으며 이것들의 조합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전체 구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생겼는데 피타고라스가 정리한 비례 법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 신선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부재들의 크기 및 이것들 사이의 위치와 관계는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례 법칙을 따랐습니다. 기둥 밑동의 반지름을 모듈로 삼아 큰 부재는 이것의 배수로 작은 부재는 분수로 각각 그 크기를 정했습니다.
비례법칙은 두 오더 양식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도리스식 오더의 주간 거리는 4.5-5.5가, 이오니아식 오더는 9-10이 표준형입니다. 기둥의 높이는 도리스식 오더는 14가, 이오니아식 오더는 18이 표준형입니다. 세부 부재의 비례는 이오니아식보다 도리스식에서 더 많이 지켜졌습니다. 이는 법규에 능한 도리안 족의 민족성이 그대로 닮아서 도리스식은 굵고 둔탁하고 남성적인 반면 이오니아식은 훨씬 더 날씬하고 섬세하며 장식적입니다. 주두도 마찬가지여서 도리스식이 납작한 원반과 판재로만 이루어지는 데 반해 이오니아식은 소용돌이 문양으로 장식했습니다.
- 출처- "한 권으로 읽는 임석재의 서양건축사"
'건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허리가 굽은 엄마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축물 (0) | 2021.08.13 |
|---|---|
| [한국의 건축가] 조민석 (0) | 2017.04.04 |
| [건축법 개정] 건축법의 중요내용(2016.2.3) (0) | 2017.03.18 |
| [건축법개정] 건축법의 중요내용(2017.1.17) (0) | 2017.03.17 |
| [건축법 개정] 건축기본법 시행령(2016.2.11) (0) | 2017.03.16 |